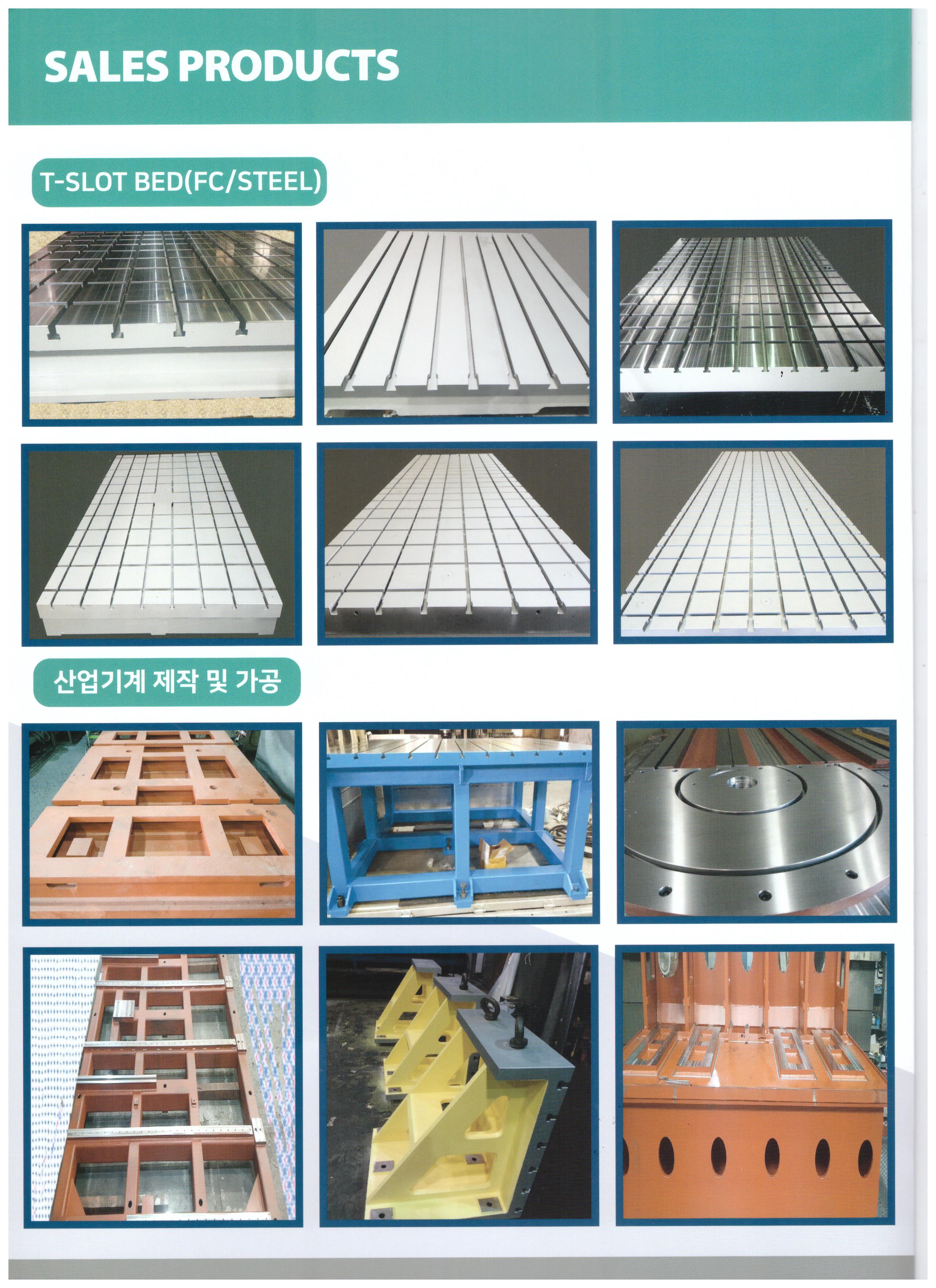과속 감시카메라 속설과 진실
교통사고를 막아주는 가장 효율적인 장치지만 바쁜 운전자들에게는 귀찮게만 느껴지는 과속단속 카메라. 달리다 한 번 '찍혔다' 하면 적게는 2만 원에서 많게는 10만여 원까지 벌금이 부과되며 벌점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하지만 출발지에서부터 목적지까지 규정된 속도만을 유지하며 달리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아무리 초보 운전자라도 확 트인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규정속도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과속단속 카메라의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과거엔 아날로그 방식의 단속 카메라가 사용됐지만 근래에는 디지털 기능을 이용한 단속 카메라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단속 성과는 눈에 띄게 향상됐다. 2007년 말부터는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구간의 평균 속도를 계산해 단속하는 '구간별 단속 카메라'까지 국내에 도입됐다.
과속단속 카메라의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운전자들의 단속을 피하는 방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그리고 세간에는 비과학적인 속설들도 난무하고 있다. 시속 200km/h 이상으로 달리면 카메라에 안 찍힌다거나, 아크릴이나 랩 등 반사를 잘 하는 물체를 번호판에 붙이면 역광으로 인해 카메라에 안 찍힌다는 설 등이 그것이다. 과속단속 카메라와 관련된 갖가지 속설들을 검증해봤다.
한때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200km/h 이상으로 달리면 과속카메라에 안 찍힌다'는 설이 있었다. 이 정도 속도로 달리면 카메라 감지 속도가 차량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것이 그 근거다. 차 번호판이 아닌 몸체만 찍힌다는 것. 하지만 이는 '속설'에 불과하다.
단속 카메라의 셔터가 눌러지는 속도는 1만 분의 1초. 과속 단속 카메라는 대부분 도로 위에 '루프(줄)' 형식의 센서를 묻어놓고 차량의 앞바퀴가 이 루프를 건드렸을 때와 뒷바퀴가 닿았을 때의 시간을 계산해 속도를 산정, 과속일 때만 찍도록 돼 있다. 이 루프는 거의 대부분 최소 카메라보다 40~50m가량 전방에 놓여 있다.
이런 방식에서는 300km/h 이상을 달리는 경주용 포뮬러 자동차라고 해도 피해갈 수 없다. 실제로 2008년도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200km/h 이상 과속했던 차량들이 25대가량 적발된 바 있다. 이 중 2대는 300km/h 가까이 달린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경찰은 "과거 1990년대 단속카메라가 레이저 방식이었을 때는 속도로 카메라를 피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았다"면서 "이 루프 방식 앞에는 카메라 바로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것도 소용없다"고 전했다. 그는 단속에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려면 적어도 카메라 100m 전방부터는 무조건 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운전자들이 착각하기 쉬운 건 뒷면을 보이고 있는 카메라다. 대부분이 반대차선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단속 카메라들은 대개 달려오는 차의 앞 번호판을 찍지만 근래에는 반대 차선의 과속 단속을 하는 것처럼 위장해 뒤쪽 번호판을 찍는 카메라들도 설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 차에 바짝 붙으면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것도 흔한 속설 중 하나다. 앞차에 바짝 붙어 가면 자신의 번호판이 가려지지 않겠느냐는 것. 하지만 디지털 방식의 현 감시카메라는 화상을 초당 수백 장씩 찍어 저장시키기 때문에 앞차에 아무리 바짝 붙어가도 이를 피해가기는 어렵다고 한다.
다만 차의 전면을 완전히 가릴 만큼 덩치가 큰 대형차 뒤에 바짝 붙어 갈 경우는 예외다. 하지만 그런 경우도 최소 2m 이내로 바짝 붙어가야 한다는 것이 교통경찰들의 설명이다. 이미 카메라에 걸릴 수준으로 규정속도를 넘어선 차라면 최소한 100km/h 이상으로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앞차와 그 정도 간격을 유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운전을 하다보면 한 차선만을 겨냥한 카메라도 간혹 눈에 띄는데 '카메라가 겨냥하고 있는 차선이 아니면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도 오산이다. 이 카메라들은 주변 차선까지 감시하고 있다고 한다.
번호판에 빛을 반사하는 랩이나 아크릴을 붙이면 어떨까. 이 또한 낭설로 밝혀졌다. 일반 투명 아크릴은 빛을 그대로 투과시키기 때문에 단속을 피할 수 없다는 것. 불투명한 아크릴이나 랩 또한 마찬가지라고 한다.
그렇다면 '차선의 중앙선을 넘어 중간에 걸친 채 달리면 안 찍힌다'는 얘기는 어떨까. 이건 위험천만한 발상이지만 예전에는 간혹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개 차선을 잡는 카메라도 반대편 차선까지는 겨냥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한다. 최근 카메라들은 최소 3m 이상의 폭까지는 찍는다고 한다. 이 경우 결국 중앙선을 거의 넘어가지 않고서는 번호판이 카메라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과속감시카메라를 피하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일까. 물론 카메라에 찍히지 않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단순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은 번호를 아예 가려 버리는 것. 테이프를 사용해 번호 중 일부를 아예 가려버리는 방법, 번호판에 진흙 등을 잔뜩 묻혀 번호를 숨기는 방법 등이다. 하지만 적발됐을 때는 일반 벌금의 20배에 가까운 과태료를 물 각오를 해야 한다.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는 중범죄에 속해 경찰에 적발되면 벌금을 떠나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 과속시 번호판이 꺾여 차량 밑으로 들어가는 특수 제작된 번호판을 달거나 특수 스프레이를 이용해 번호판을 가리는 것 등도 적발되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최근에는 방해전파를 쏘는 최첨단 장비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바로 '제미니'라는 장치다.
차 번호판 양쪽에 설치하게 돼 있는 손바닥 절반 크기의 이 장치는 방해전파를 이용해 속도측정을 막아준다. 이동식 단속 카메라는 차량에 레이저를 쏜 뒤 빛이 반사돼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해 속도를 측정하는데, 차 번호판 양쪽에 달린 이 장비가 단속 카메라에서 나오는 레이저를 감지한 뒤 방해전파를 쏴 속도를 측정할 수 없게 만드는 것.
하지만 이 장치를 달았다가 적발되면 역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한다. 또한 이 장치는 이동카메라에만 효과가 있을 뿐 '루프' 형식을 사용하는 단속카메라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매발톱(야생화) (0) | 2009.08.11 |
|---|---|
| 이것이 산삼 맞나요? (0) | 2009.07.06 |
| 마이클잭슨-파라포셋, 세기의 두스타 파란만장 인생 끝 ‘사망’ 비통 (0) | 2009.06.26 |
| 아직도 소를 논을 갈고 있네요 (0) | 2009.05.11 |
| 아직도 소를 논을 갈고 있네요 (0) | 2009.05.11 |